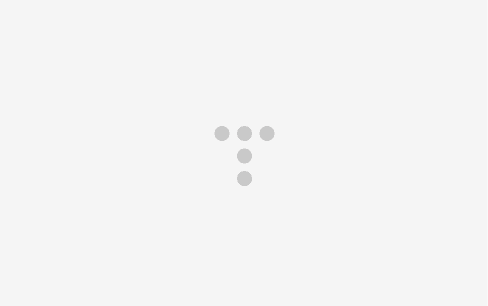무위진인(無位眞人)
인생을 탕진하진 말아야 하겠다
당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말 할 때는 당차게 말하고 침묵할 때는 묵연히 허공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는 “그게아니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나는 항상 부럽다. 내 자신이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비단 나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다수 주관을 가지고 살지 못할 뿐더러 남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흔들린다. 더 심한 것은 ‘나’ ‘나’ ‘내가’ ‘내가’하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보라면 머뭇거리고 머리를 긁적거린다.
임제선사는 자리 없는 참사람을 말한다. 그 자리 없는 참사람을 차별 없는 참사람이라고도 한다. 히사마쯔 신이찌 선사는 그 사람을 무상(無相, formless self)의 자기라고 표현하다.
이 자리 없는 참사람, 무상의 자기가 무위진인(無位眞人)이다. 임제선사는 이 무위진인을 일컬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붉은 몸뚱이에 한 자리 없는 참사람이 있다. 항상 그대들의 얼굴로 출입한다. 아직 확증을 잡지 못한 사람은 보아라, 봐!”(《임제록》)
왜 자리 없는 참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떻게 경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모습으로도 그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한 자리가 없다. 형상은 물론 자아의식을 벗어나 있다. 때문에 무상의 자기라는 표현이 거기에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무상의 자기는 특정한 모습과 형상에, 자리와 지위에, 계급에, 체면에, 나이와 염치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비굴이란 없다. 당당하게 소리치고 당차게 말한다. 지혜가 밝기 때문에 그 말에 걸림이 없고 모순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그를 존경하며 그처럼 살기를 원한다. 그는 깨달은 사람이다. 참사람이다. 참부처이다.
그러한 사람은 공간적으로 무변하게 세계를 형성하고 시간적으로 무한하게 역사를 창조한다. 그는 사물에도 마음에도, 그러고 부처에도 결박되지 않는다. 그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그 무상의 자기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당당하게 걸어간다. 한없이 자유롭다.
적어도 이러한 자유로움과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사람은 나랑은 거리가 먼 당신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또한 좌절이 깊기도 하다.
그런데 임제선사는 그 무상의 자기가 절 멀리 있지 않다고 하지 않는가. 항상 이 붉은 살덩어리, 이 발가벗은 육신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밥먹고 세수하고 말하는 내 얼굴에 항상 출입하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내 몸에 이미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다시 방황하며 다른 곳을 찾아 헤맨다. 그래서 임제선사는 무위진인을 보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히사마쯔 신이찌 선사의 말을 떠올려 본다.
"보통 불성은 내재적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불성의 존재방식은 초월도 아니고 내재도 아니며, 또 그 중간도 아닌, 그것들을 끊은 영원한 현재이다. 이 자성의 현전 혹은 자각이 깨달음이다."
무위진인, 그 자리 없는 참사람, 진불(眞佛)이 씨앗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우리를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이 자리, 내 육신 속에서 고동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위진인, 그 자리 없는 참사람을 내 몸에서 봐야겠다. 내 몸에서 역력히 체험해야겠다. 그러면 나는 당당할 수 있으리라. 어두운 광야에서도 우렁우렁 소리 칠 수 있으리라.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으리라. 안절부절하며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이제 더 이상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낄 수는 없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한숨으로 인생을 탕진하진 말아야겠다. 새해에는 별 볼일 없는 작은 육체일망정, 내 얼굴에 출입하는 무위진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리라.

선불교 7. 진짜 자유인(無位眞人)
* 진짜 자유인(無位眞人)
“여기 빨간 고덩이 안에 한 自由人(無位眞人)이 있어 恒常 여러분의 눈. 코. 귀. 입 등을 통해 出入한다.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똑똑히 보아라.”
臨濟의현禪師의 有名한 上堂法語다. 이 法語가 禪宗史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참으로 엄청나다. ‘無位眞人’이라는 話頭의 의미 천착은 뒤로 미루고 우선 法語에 이어진 거량(擧揚)을 보자.
法門이 끝나자 한 중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차별 없는 참사람[無位眞人] 입니까?”
臨濟는 법상(法床)에서 내려와 質問한 중의 멱살을 움켜잡고 윽박질렀다
“말해봐라! 말해봐라!”
중이 무슨 말을 꺼내려 하자 臨濟는 그를 밀쳐버리면서 한마디를 던졌다
“無位眞人이란 무슨 똥막대기인가."
臨濟는 이렇게 이른 후 곧장 方丈으로 돌아가버렸다.
‘無位眞人’이란 차별 없는 참사람, 自由人, 萬民平等을 뜻하는 말이다. 位階와 家門을 重視하는 當時 中國社會에서의 이 같은 發言은 매우 革命的인 社會思想을 含蓄한다. 禪學的으로는 ‘무(無)’를 自覺하는 자기를 ‘無位眞人’ 이라 한다. 無를 自覺한 자기야말로 참된 人格者다. 無位眞人은 人格과 事物을 區分하지 않고 자신과 모든 事物이 함께 연기(緣起)하고 손님과 主人 關係를 相互 交換하는 世界에서 산다. 다시 말해 人間과 自然이라는 相對的 區分 같은 게 전혀 없다. 臨濟의 禪思想은 ‘眞人’ 이라는 이 한마디로 壓縮된다. 너와 나라는 相對的 區分을 넘어선 絶對的 主體로서의 ‘絶對自我’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主體性이기도 하다. 臨濟는 一生동안 이 ‘眞我’를 弟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고함소리[喝]와 몽둥이질을 멈추지 않았다.
원래 ‘眞人’이란 장자(莊子)에 자주 등장하는데 理想的 人間像, 고매한 人格을 뜻하는 말이다. ‘無位眞人’이라는 話頭는 臨濟의 革命家的 氣質을 거울처럼 드러내 보여준다. 그의 革命性은 ‘살아 펄떡펄떡 뛴다[活鱍鱍地]’라는 話頭에도 잘 나타나 있다.
“아주 自由롭고 싶다면 지금 내 說法을 듣고 있는 그대들이라는 人間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정해진 形態나 모습이 없고, 意志하는 바 없고, 머무는 곳 없이 살아 펄떡펄떡 뛰며 그치는 일이 없다.”
話頭 ‘活鱍鱍地’ 가 뜻하는 바는 主體와 行動사이에 分裂이란 있을 수 없으며 정해진 形態나 法則性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旣成의 틀을 단호히 拒否하는 革命的 熱情이 가득하다. 臨濟의 法問 뒤 거량을 살펴보자. 중이 묻고 있는 ‘無位眞人’은 眞人에 대한 一般的 정의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眞人을 보여달라는 要請이다. 臨濟는 각자의 얼굴 위에서 眞人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네놈은 쓸모없는 똥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무지렁이라고 叱咤한다. 우리 俗談에 아주 無價値하고 卑賤한 存在를 ‘똥친 막대기’ 라고 하지 않는가. 臨濟의 ‘이 무슨 똥막대기인가’ 라는 호통 속에는 ‘네가 바로 無位眞人이다“ 라는 소식이 들어 있다.
臨濟가 돌아간 방장은 조실이나 주지의 居室을 말한다. 禪에서는 本來의 마음자리, 歸依處, 적정(寂靜), 本來面目 등을 象徵한다. 따라서 임제의 방장 歸還은 無心의 境界로 돌아가 宇宙를 大肯定하는 道人의 安住를 뜻한다.
어디서고 주인이 되라(隨處作主立處皆眞)
“함께 道를 닦는 벗들이여, 佛法은 人爲的인 造作이 필요없다. 꾸밈이 없는 平常의 자유로움, 있는 그대로의 삶, 便所에 가고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疲困하면 쉬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알지 못하고 웃지만 智慧로운 사람은 꾸밈없는 日常의 소중함을 안다. ...... (중략) .... 求道者 여러분 ! 어느 場所에서든 主體的일 수만 있다면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境界에서도 잘못에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또 종래의 나쁜 습기(習氣)와 無間地獄에 떨어지는 카르마(業)가 있더라도 삶은 자연히 解脫의 큰 바다로 변한다.”
臨濟의 上堂 法問이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州 立處開眞)’ 이라는 話頭는 嚴肅한 佛敎 法問이 아니더라도 흔히 듣는 이야기다. 代表的인 예의 하나가 우리 俗談 가운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精神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다. 한마디로 主體的 自覺이 없는 人間은 사람으로서의 存在價値가 없다는 것이다. 臨濟의 ‘隨處作州 立處開眞‘은 전적으로 實存主義와 一致한다. 자기 本體를 굳건히 지켜 나가는 것이 實存主義다. 自己 本體란 ‘絶對自由’다. 絶對自由를 放蕩과 混沌해서는 안 된다. 放蕩이 아닌 絶對者由의 주춧돌은 主體性이다.
다시 말해 人間은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立場을 確實히 짚어나갈 때, 分數를 알 때, 시쳇말로 자신의 ‘主題’를 正確히 把握할 때에만 그에 相應하는 自由를 누릴 수 있다. 法問中의 “대소변 보고, 옷 입고 밥 먹는 일(屙屎送尿 着衣喫飯)”은 누구라도 每日하는 動作이고 平凡한 日常이다. 그리고 이런 일에는 意識的인 努力이 필요없다. ‘屙屎送尿 着衣喫飯’과 같은 日常事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
훌륭한 政治도, 玄學的인 高談峻論도, 고매한 聖人의 人格도 이 平常事 이후의 일이다. 禪은 眞理를 觀念的인 理論이나 玄學的 論理로 說明하기를 拒否한다. 그리고 眞理가 저 강 건너 彼岸에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우리의 平凡한 日常生活속에 모든 眞理가 묻혀 있다는 立場이 禪의 眞理觀이다.
위부(魏府)의 화엄(華嚴)장로는 이렇게 說破하였다.
“佛法은 나날의 生活 그 自體이다. 그대들이 행주좌와(行住坐臥), 보통의 다반사(茶飯事), 친구와 만나는 일들이 바로 佛法이다.”
“道란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앞에 展開되고 있는 사사물물(事事物物)속에 眞理가 들어있다. 聖人도 먼 곳에 있거나 구름 속에서 이슬을 먹고 사는 存在가 아니다. 깨달으면 바로 聖人이다. 이것이 東洋哲學이 傳統的으로 追求해 온 眞理觀이다.”
“어느 곳에서든 主人이 되어서 서 있는 곳마다 眞理가 되게 하라”
어떤 境遇에도 自信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참되다는 말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구마라즙의 4대 제자중 수제자인 승조(383-414)법사의 유명한 ‘부진공론(不眞空論)’에서부터 이같은 불교의 眞理觀이 强調 어왔다. 승조는 이같이 說破하였다.
“聖人은 모든 變化를 따르면서도 변하지 않고, 한없는 束縛도 스스로 빠져 나간다. 萬物은 그 自體가 空이라는 道理에 通達해 있기 때문이다.”
즉 凡夫의 일을 나타내면서 도법(道法)을 버리지 않는 것이 聖人이다. 道法이란 ‘主人意識’, 善과 惡을 區分할 수 있는 ‘主體的 自覺’을 뜻한다. 臨濟는 ‘무(無)’를 自覺하는 自己, 공(空)을 깨닫는 主體로서의 自己를 理想的인 人格으로 設定하고 그 같은 참된 人格者를 ‘無位眞人’이라 했다. 어떠한 階級 身分에도 屬하지 않는, 높고 낮은 身分上의 區別을 뛰어넘은 無位眞人의 삶이 바로 ‘隨處作州 立處開眞’이다.
眞人은 自己와 남이 모두 무상성(無常性)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만이 아닌 모두가 無常性을 함께 벗어나기를 바라는 카루나(karuna : 同悲感情)를 갖는다. 왜냐하면 眞人은 늘 自己와 모든 事物이 함께 生成되고 그 주객(主客)의 關係를 서로 바꿔가질 수 있는 世界에서 살고 있지 절대로 혼자 떨어져 隱遁하거나 逃避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비감정(同悲感情)은 ‘無’를 自覺하는 自己의 智慧와 他人에 대한 同情心에서 생겨난다. ‘無’의 自覺이란 생멸전화(生滅轉化)를 떠난 永遠不滅은 어디에도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는 無常과 生滅轉化 그 自體가 바로 眞理라는 이야기다. 태어났으면 죽어야 한다. 肉體的 生命의 永遠性이란 거짓말이다. 그러나 生의 時限性을 克復하는 한 가지 方法이 있다. 바로 삶과 죽음이 本質的으로는 똑같은 것이고 根源은 한 뿌리라는 생사일여관(生死一如觀)이다. 禪은 사기꾼처럼 生命의 永遠性을 팔아먹는 詭辯을 拒否한다.
그래서 禪師들은 懇切한 同悲感情으로 모든 森羅萬象의 存在가 생(生)이 있으면 반드시 사(死)가 있다는 ‘無常性’을 自覺하길 바란다. 단 한 번밖에 없는 人生이요 삶이다. 삶이란 오직 지금 당장의 일을 順序대로 잘 處理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념무상(無念無想)이다.
臨濟는 또 이렇게 喝破하였다.
“이 삶 그대로가 모든 求道者들이 돌아가 쉬는 眞理의 故鄕이다.” (一切處是道流歸舍處)
진정한 見解를 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생생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現在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흔히 말하는 '日常主義(Everdayism)'로 誤解해선 안 된다. 臨濟가 말하는 自由人은 매일매일의 日常事에 시달리면서도 그것들에 迷惑당하는 일이 없는 무사인(無事人)이다. 이것이 바로 無念無常이다.
明代의 修身書로 지금도 韓, 中, 日 3국에서 많이 읽히는 “채근담(菜根譚)”은 無念無常을 아주 明瞭하게 說破한다.
“지난일의 생각[前念]에 얽매여 끙끙거리지 않고 未來에 닥쳐올 일들에 대한 생각[後念]을 맞이하길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차례로 整理해 나갈 수 있다면 저절로 無念無常의 境地에 들어갈 수 있다.”
老子가 말하는 ‘무위(無爲)‘ 도 바로 이런 것이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無爲가 아니다. 오히려 ‘無爲’는 한없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日常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두 일이 아닌가. 밥 먹는 일, 오줌 누는 일 등 모두가 일이다.”
다만 道를 따라 自然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떠한 人爲的 造作도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自然의 道란 배고프면 밥먹는 것이다. 배불리 食事한 후에는 밥을 더 먹을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된다. 흔히 말하는 順理대로 사는 것이다.
‘自然’은 順理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무사(無事)는 엉뚱한 妄念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無間地獄은 父母殺害, 阿羅漢 殺害, 佛身毁損, 僧團和合 破壞등 悖倫的인 오무간업(五無間業)을 지으면 떨어지는 곳이다. 臨濟는 이러한 大逆罪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깨달음만은 얻고야 말겠다는 積極的인 意志를 强調하고 있다.
***중국선불교/선불교(禪佛敎)의 다른 글
- 선불교 6. 빈 터의 흰소(露地白牛)* 빈 터의 흰소(露地白牛) 묻는다 : 어떤 것이 빈터의 흰 소인가?(如何是露地白牛) 답한다 : 음 ~ 매, 음 ~ 매 묻는다 : 자네 벙어리인가? 답한다 : 자네는 어떠한가? 묻는다 : 이 짐승아! 臨濟義玄이 묻고 행산감홍(杏山鑒洪)이 답한 禪問答이다. 語錄에 나오는 白牛, 또는 수고우(水牯牛)등의 소는 ..공감수0 댓글수0 2007. 8. 10.
- 선불교 5. 네놈은 애꾸눈이다(只具一隻眼)* 네놈은 애꾸눈이다(只具一隻眼) 어느날 臨濟院을 찾아온 보화화상에게 臨濟義玄禪師가 특별히 상을 차려 供養대접을 했다. 보화는 밥은 안 먹고 채소 반찬만 다 먹어 치웠다. 臨濟가 無意識중에 한마디했다. “꼭 당나귀 같군!” 普和는 곧바로 상에서 물러나 땅에 두 손을 짚고 ‘애해앵’ 하며 당..공감수0 댓글수0 2007. 8. 10.
이 블로그 인기글
'홈지기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선한 목자 예수 (0) | 2022.09.01 |
|---|---|
| 죄로부터 자유함을 (0) | 2022.09.01 |
| 음악으로 가는 길 (0) | 2022.08.29 |
|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즘 (0) | 2022.08.28 |
|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 (0) | 2022.08.26 |